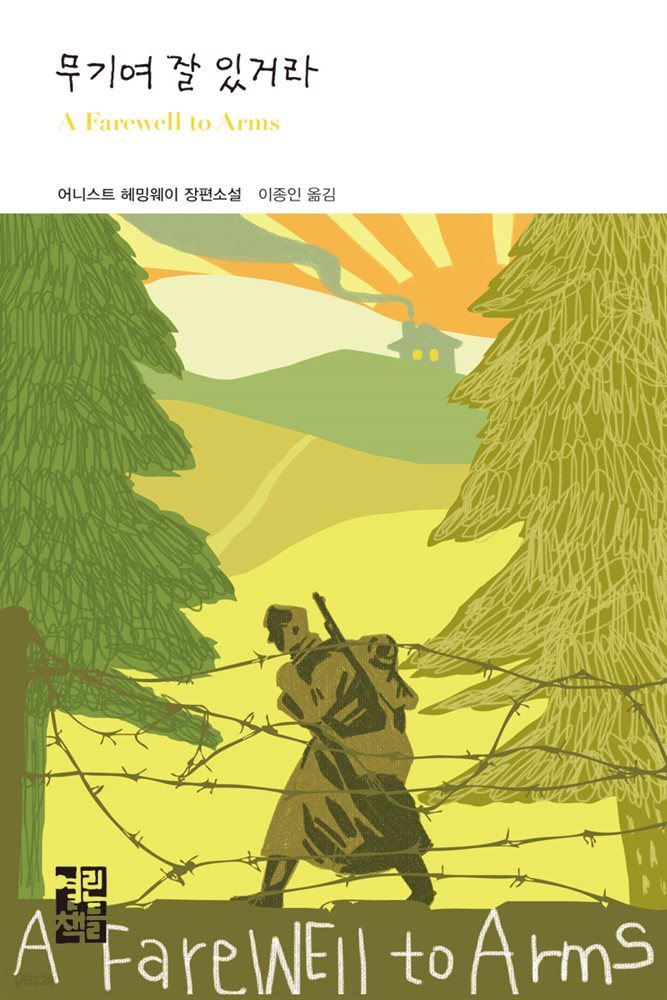이 도서의 시리즈 내서재에 모두 추가
이 상품의 태그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소개 (2명)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회원리뷰 (11건) 회원리뷰 이동
한동안 책을 놓고 살았더니,
다시 책이 읽고 싶어졌을 때 어떤 책을 읽을지 고민하게 되더라.
그래서
요즘 나는 작가들 위주로 책을 읽고 있다.
무엇을 읽을까,하고 고민될 때 작가를 기준으로 삼고 나면 그 다음 고민들은 술술 풀린다.
작가의 모든 책들을 출판 연도별로 읽어도 좋고
책들을 나열하여 읽고 싶은 책을 먼저 읽어도 되기 때문이다.
작년엔 헤르만 헤세를 읽
리뷰제목
한동안 책을 놓고 살았더니,
다시 책이 읽고 싶어졌을 때 어떤 책을 읽을지 고민하게 되더라.
그래서
요즘 나는 작가들 위주로 책을 읽고 있다.
무엇을 읽을까,하고 고민될 때 작가를 기준으로 삼고 나면 그 다음 고민들은 술술 풀린다.
작가의 모든 책들을 출판 연도별로 읽어도 좋고
책들을 나열하여 읽고 싶은 책을 먼저 읽어도 되기 때문이다.
작년엔 헤르만 헤세를 읽었고 올해는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작품들을 도전하고 있다.
독서가 즐거움이어야 할 텐데 언젠가부터 도전이 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책 읽을 시간이 많지도 않고,
좋은 책들은 왜이리 두꺼운지.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보다는
그나마 양반이라 무기를 먼저 읽었다.
씌여진 순서를 보더라도 먼저이긴 하지만.
이 책의 주인공인 헨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성장한다면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로버트 조던이나, <노인과 바다> 산티아고와 같은 인물일지도 모른다는
번역가의 통찰이 도움이 되었다.
세계대전의 이야기는 다양한 이야기 소재로
익히 봐왔던 터라 진부할만도 할 텐데 이야기 속에서 작가가 담아내는
메시지는 다양한 각도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시대만 다를 뿐이지 어쩌면 우리도 소리없는 전쟁터에서 살고 있지 않던가.
주인공이 느꼈을 삶의 허무라던가 삶의 다채로운 얼굴을
마주해야 했던 고난과 상실은 비단 책속이야기만은 아닐 것이다.
코시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어쩌면 헨리일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헨리가 되어 있겠지.
무덤덤하게 받아들여야만 했던 헨리.
인생은 예측불허라고 했던가.
우리는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살아가지 않기에
헨리가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던 것처럼 매순간
묵묵히, 그저 살아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내가 쓰러지는 날도 오겠지.
내 옆의 누군가가.
그 누군가의 누군가가.
그렇게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소리없는 전쟁이.
헤밍웨이 대표작. #태양은다시떠오른다는 별로였는데 이 책은 재미있었다. 전쟁 묘사가 너무 사실적이어서 독자들이 작가가 실제로 현장에 있었다고 믿었다고 한다. 이 책을 헤밍웨이 본인은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작품이라고 말했다는데 과연 사랑이야기. 헤밍웨이를 폄훼하는 비평가들이 <애니 AANI> 즉, <행동만 있고 사상이 없다 All Action No Idea> 라고 진단 하기도 하고,
리뷰제목
헤밍웨이 대표작. #태양은다시떠오른다는 별로였는데 이 책은 재미있었다. 전쟁 묘사가 너무 사실적이어서 독자들이 작가가 실제로 현장에 있었다고 믿었다고 한다. 이 책을 헤밍웨이 본인은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작품이라고 말했다는데 과연 사랑이야기.
헤밍웨이를 폄훼하는 비평가들이 <애니 AANI> 즉, <행동만 있고 사상이 없다 All Action No Idea> 라고 진단 하기도 하고, 주인공이 나이만 먹을뿐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혹평도 했단다. 그말에 동감이 되는 부분도 분명 있었다.
그럼에도 어느시대에 읽어도 현대에 씌여진 작품 같다는 평처럼 1920년대 작품 같지 않다. 문체나 이야기를 끌고 가는 구성이나 묘사는 매우 현대적이었다. 여자에 대한 생각만 낡았을 뿐. 비오는 밤에 배에 올라 노를 저으며 스위스로 도망치는 장면은 스릴 장난아니다. 마지막에 캐서린이 아이를 낳는 장면도 처연하게 긴박하다.
헤밍웨이 작품을 하나 더 읽어야겠다.
헤밍웨이를 폄훼하는 비평가들이 <애니 AANI> 즉, <행동만 있고 사상이 없다 All Action No Idea> 라고 진단 하기도 하고, 주인공이 나이만 먹을뿐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혹평도 했단다. 그말에 동감이 되는 부분도 분명 있었다.
그럼에도 어느시대에 읽어도 현대에 씌여진 작품 같다는 평처럼 1920년대 작품 같지 않다. 문체나 이야기를 끌고 가는 구성이나 묘사는 매우 현대적이었다. 여자에 대한 생각만 낡았을 뿐. 비오는 밤에 배에 올라 노를 저으며 스위스로 도망치는 장면은 스릴 장난아니다. 마지막에 캐서린이 아이를 낳는 장면도 처연하게 긴박하다.
헤밍웨이 작품을 하나 더 읽어야겠다.
익히 유명한 작가 헤밍웨이는 올 7월에야 비로소 내게 왔다.
짧은 분량의 <노인과
바다>를 읽었고, 이어 <무기여 잘 있거라>를 들었다.
그것도 계기가 없었던 건 아니다.
단지 실수로 끓는 물을 발등에 쏟아 화상병동에 입원할까
하다 통증이 가라앉아 통원치료 받으며 장마와 월드컵시즌에 헤밍웨이를 비롯하여 몇몇 세계명작과 조우하였다.
혈기왕성하고 정
리뷰제목
익히 유명한 작가 헤밍웨이는 올 7월에야 비로소 내게 왔다.
짧은 분량의 <노인과
바다>를 읽었고, 이어 <무기여 잘 있거라>를 들었다.
그것도 계기가 없었던 건 아니다.
단지 실수로 끓는 물을 발등에 쏟아 화상병동에 입원할까
하다 통증이 가라앉아 통원치료 받으며 장마와 월드컵시즌에 헤밍웨이를 비롯하여 몇몇 세계명작과 조우하였다.
혈기왕성하고 정의로운 헨리는 미국청년으로 이탈리아 의무대에
자원 입대한다.
역시 자원 입대한 영국인 간호사 캐서린과 만나게 되고
어수선한 전쟁의 분위기 속에서 믿고 의지할 목적이 되는 거침없는 사랑이 구원처럼 다가온다.
후퇴하는 중에 아군의 즉결처형을 피하여 탈영에 이르고
연인과 보트를 이용하여 스위스로 망명길에 성공한다. 고진감래…남은
것은 장밋빛인데 님은 피안의 세계로 가셨다.
불 같은 사랑을 하였으되 쓸쓸하게 돌아서야 하는 남성들은
헨리이고 <개선문>의 라비크이다. 속전속결의 대화체가 시원시원하게 페이지를 넘기게 하고 음산한 전쟁과 함께 사랑은 뜨거운 만큼 비극은 예정되어
있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마주하는 사안에서 줄기가 보인다고 할까. 누렸던
쾌락만큼 상응하는, 반대급부로서 고통이 수반하는 것이며 플러스 마이너스 합이 0 으로 귀결되더라는 거다. 불행을 겪은 자가 행복의 참 맛을 음미한다는
것처럼. 헨리와 라비크는 동일인인양 내게 그렇게 다가왔다.
추억은 존재하지만 후회는 결코 아닐 것이다.
우리의 헨리는 이후 묵직한 삶을 살아가리라.
헤밍웨이와 부친이 권총자살로 마감했다는 것, 이 소설의 모델이 된 여성이 연하 헤밍웨이보다 나은 조건의 남성을 택해 유명인 배우자를 걷어찬 격이 되었고, 노벨상을 수상한 그가 걸 맞는 대작을 써야 한다는 강박과 경제난을 걱정하여 정신병원의 신세를, 위상을 고려하여 병원의 만류를 뿌리치고 퇴원 이틀 후 자살, 사후
거금의 재산을 미망인에게 남겨놓았다는 사실은 모두가 凡人이라는걸
보여준다.
헤밍웨이도 헨리도 독자인 나도 평범한 사람이고, 지금엔 헨리도 시대를 거슬러 이미 고인이리라. 나두 꽤나 세월을
넘겼기에 이런 사랑은 풍경화로 남기자.
약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다.
사무직을 버리고 책을 읽거나 리뷰를 작성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틀을 지었기 때문인데 지나간 세월은 담을 수 없고 형체 없는 공백은 무의미와 비례하였다.
책을 읽고 흔적을 남기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리라.
헤밍웨이의 작품 중에서 “무기여 잘 있거라” 라는 다소 낭만적인 제목 때문에 대중의 뇌리에 쉽게 각인되어 있지만 그 내용까지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다.
거∼있잖아. 전쟁....소설...하는 정도?
하긴 이 말 속에 작품의 모든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이탈리아 동북부 전선에서 자원 근무하던 의무장교 프레더릭
리뷰제목
헤밍웨이의 작품 중에서 “무기여 잘 있거라” 라는 다소 낭만적인 제목 때문에 대중의 뇌리에 쉽게 각인되어 있지만 그 내용까지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다.
거∼있잖아. 전쟁....소설...하는 정도?
하긴 이 말 속에 작품의 모든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이탈리아 동북부 전선에서 자원 근무하던 의무장교 프레더릭 헨리는 포격으로 부상을 입고 후방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으며 간호사 캐서린을 다시 만나 깊은 사랑을 나누다가 탈영하고 스위스 로잔의 한 병원에서 캐서린이 아이를 낳다가 아이와 함께 죽음으로 끝을 맺는 내용이다.
이 작품은 헤밍웨이가 실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진 작품이다.
비록 한달 남짓이지만 이탈리아 전선에서 구급차 운전사로 근무하다 부상을 입고 후송된 병원에서 미모의 간호사를 만나 사랑에 빠졌지만 결혼까지는 이르지 못한 경험을 모두 이 작품의 뼈대로 이용하였다.
거의 모든 소설은 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대부분의 소설은 ‘사소설’이라 이름해야 마땅할 것이다.
헤밍웨이를 생각할 때는 그의 작품에 앞서 이름에 대한 묘한 끌림이 먼저 떠오른다.
‘어니스트 헤밍웨이’
그 이름을 조용히 입 안에서 굴려 발음해 보면 얼마나 부드럽고 달콤하게 발음이 되는지,
처음 그의 이름을 들으면서 느꼈던 생각이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헤밍웨이는 이 작품을 통해서 <생물적 덫>과 <단독 평화조약>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 세상은 착하고 온순한 사람일수록 더욱더 죽이려 드는 <생물적 덫>에 빠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탈피하기 위해서 개인은 투쟁해야 하며,
사람을 죽여야 하는 전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강물에 뛰어들어 탈영하는 방법으로 <단독 평화조약>을 구체화한다.
주인공 헨리는, 장교용 창녀집에서 위로를 받으며 순간의 쾌락을 추구하는 허무주의자 군의관 리날디와 전쟁이라는 고통 속에서도 언젠가 신의 구원을 의심치 않는 사제 사이에서 방황하다가 캐서린을 만나 사랑에 빠지면서 급격하게 삶의 가치 쪽으로 기울어지고 마침내 탈영으로 스스로의 <단독 평화조약>을 완성한다.
그것은 결국 사제가 말했던 <획기적인 일>이 벌어진 것이기도 하였다.
캐서린의 죽음으로 엄청난 사랑의 부채를 안은 헨리는 과연 이 후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
그의 삶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따름이지만,
헨리의 이후 삶이 헤밍웨이가 제대 후 걸어왔던 마초적인 남성성으로 완벽하게 감싸였던 삶이라고 말한다면 캐서린의 죽음이 너무 허무하지 않은가
책을 읽다 보니 1부 2장의 첫 줄이 눈에 확 들어온다.
“이듬해에는 승리가 잦았다.”
굉장히 낯익은 느낌에 한참을 생각하다 김훈의 칼의 노래를 펼쳤다.
그 소설의 첫 줄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김훈 선생의 이파리와 줄기를 모두 떨어버린 저 앙상한 필체를 여기서 문득 만나다니.
주어와 서술어로 구성된 가장 단순한 문장의 아름다움에 나도 점점 매료되어 가는 것일까
전혀 뜻밖의 작은 발견이 나를 미소 짓게 만들었다.
이 제목의 소설을 읽고 싶었고, 저 표지의 책으로 꼭 읽어야겠다고 작년부터 생각했었다
그런데, 난 역시... 책을 읽고 핵심을 찾아내지 못하나보다.
당장, 신성일이랑 엄앵란이 튀어나올것만 같은 스토리나 대사는 슬쩍 웃음이 나올 정도였고,
꿈보다 해몽이라고, 다 읽고 해설 부분을 보니..역시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 그래도 재미난건...
리뷰제목
이 제목의 소설을 읽고 싶었고, 저 표지의 책으로 꼭 읽어야겠다고 작년부터 생각했었다
그런데, 난 역시... 책을 읽고 핵심을 찾아내지 못하나보다.
당장, 신성일이랑 엄앵란이 튀어나올것만 같은 스토리나 대사는 슬쩍 웃음이 나올 정도였고,
꿈보다 해몽이라고, 다 읽고 해설 부분을 보니..역시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 그래도 재미난건...해설 부분에서 인용한 문장들에 대부분 나도 밑줄을 치고 읽은건 조금 뿌듯한느낌도 들었다. 해답지도 아닌데 말이다.
헨리가 캐서린에게 갖는 마음의 변화는 조금 낯설다.
처음에는 그냥 하룻밤 상대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았는데, 탈리아멘토 강인가 하는 곳에 뛰어 들면서 전쟁과는 굿바이 하고, 캐서린에 새로운 감정을 느끼는게...과연 가능할까?
결말도, 인상적이지 않고 상투적이기까지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전 읽는 재미는 쏠쏠하다.
일단 1915년에서 1918년까지의 1차 세계대전 기간의 시대 모습을 살짝 엿볼 수 있다.
그 시절 어딘가에선 마구 죽어나갔을텐데, 호텔에서 룸서비스나 시켜먹는 커플을 보면...예전이나 지금이나, 일단 돈은 있고 봐야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리고, 한 남자의...도통 공감되지 않는 감정의 변화는...또 역시 저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또 다른 삶의 레퍼런스가 생긴 것 같기도 하다.
" 비겁한 자는 1천번을 죽고, 용감한 자는 한 번 밖에 죽지 않는대."
" 물론 그렇죠.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 모르겠어 "
" 그 말을 한 사람은 어쩌면 비겁한 인간이었을 거예요." 그녀는 말했다. " 겁쟁이에 대해서는 많이 알았지만, 용감한 사람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거죠. 용감하고 총명한 사람이라면 2천번은 죽을 거예요. 단지 그 무수한 죽음을 말하지 않을 뿐이죠." -188쪽-
나도, 제기랄, 나도 그렇게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지.
그렇게 죽으면 태어난 이후의 이런 죽음의 고통은 겪지 않아도 되겠지. 이제 캐서린은 죽을 것 같아. 사람은 누구나 죽어. 죽는다고.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죽어가지. 결코 그 의미를 개우칠 시간의 여유도 없이. 인간은 이 세상에 내던져진 다음 세상의 규칙을 일방적으로 통지 받는거야. -428쪽-
그리고, 329쪽, 338쪽, 335쪽의 위트있는 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