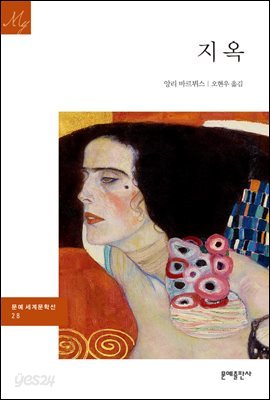이 도서의 시리즈 내서재에 모두 추가
회원리뷰 (4건) 회원리뷰 이동
앙리 바르뷔스의 지옥은 처음 몇 장을 펼칠 때에는, 이 작품의 이질적인 분위기에 적응하기 힘들어서 좀 헤맬 수도 있을 작품입니다. 하지만 일단 그 분위기에 적응하고 나면, 다른 곳에서는 접하기 힘든 강렬한 인상에 이끌리고, 이내 몰입하게 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평범한 일상마저도 시처럼 그려내는 묘사, 수많은 사람들의 미묘한 심리 묘사를 생생하게 표현한 부분 등이 좋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도 인간은 죽음을 생각한다. 근원을 알 수 없는 고독은 거기서 오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집착하리만큼 <지옥>은 ‘죽음’에 대해 파고든다. 주인공 나는 호텔에 머무는 장기 투숙객이다. 그는 자신의 침대 위 구멍을 통해 옆방을 훔쳐보게 된다. 순간의 호기심은 이제 그의 삶을 지배하는 일상이 된다. 옆방에는 매 번 다른 사람들이 머물다 간다. 불륜 커플, 이제 사랑을 시작한 연인들, 시한부 환자 등등.
그들의 대화는 구멍을 타고 주인공에게 그대로 전달된다. 다른 사람의 정사를 훔쳐보고 은밀한 비밀을 엿듣는다. 허무함으로 가득 찬 그는 어디에도 정을 붙일 데가 없다. 그러다 옆방에 머무는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 그는 모든 인간들이 외로워하고 괴로워한다는 걸 깨닫게 된다.
주인공은 지금 이 순간이 곧 사라지게 된다는 것에 허무해한다. 내가 그에게 공감하는 부분이다. 내 흔적조차 곧 없어지겠지. 먼 훗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든 게 환상 같을 것이다. 애초에 인간이란 그렇게 태어났음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즐겁게 사는 방안도 있다. 하지만 소심하고 생각 많은 주인공은 좌절하고 슬퍼한다. 소유하지 못한 걸 원하듯, 인간은 불멸을 원한다!
이 소설에서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단어가 ‘죽음’과 더불어 자주 사용된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십자가에서 처형되었다고도 표현한다. 마음 한 구석에 있지만 생각하기 싫은 ‘최후의 순간’에 대해서도 생각해본다. 인간은 시간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슬플 수밖에 없는 존재다.
"시간이란 지칠 줄 모르는 희망을 단절한다. 희망은 끝없는 운동으로 솟아오르지만 불멸의 모티프, 즉 시계에서 떨어져내리는 그 결정적인 아다지오를 흩트려버리진 못한다...... 그리고 그 끊어진 멜로디는 오직 비애를 아름다움으로 바꿀 수 있을 뿐이다. p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