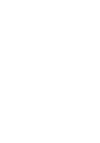이 상품의 태그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상세 이미지 상세 이미지 보이기/감추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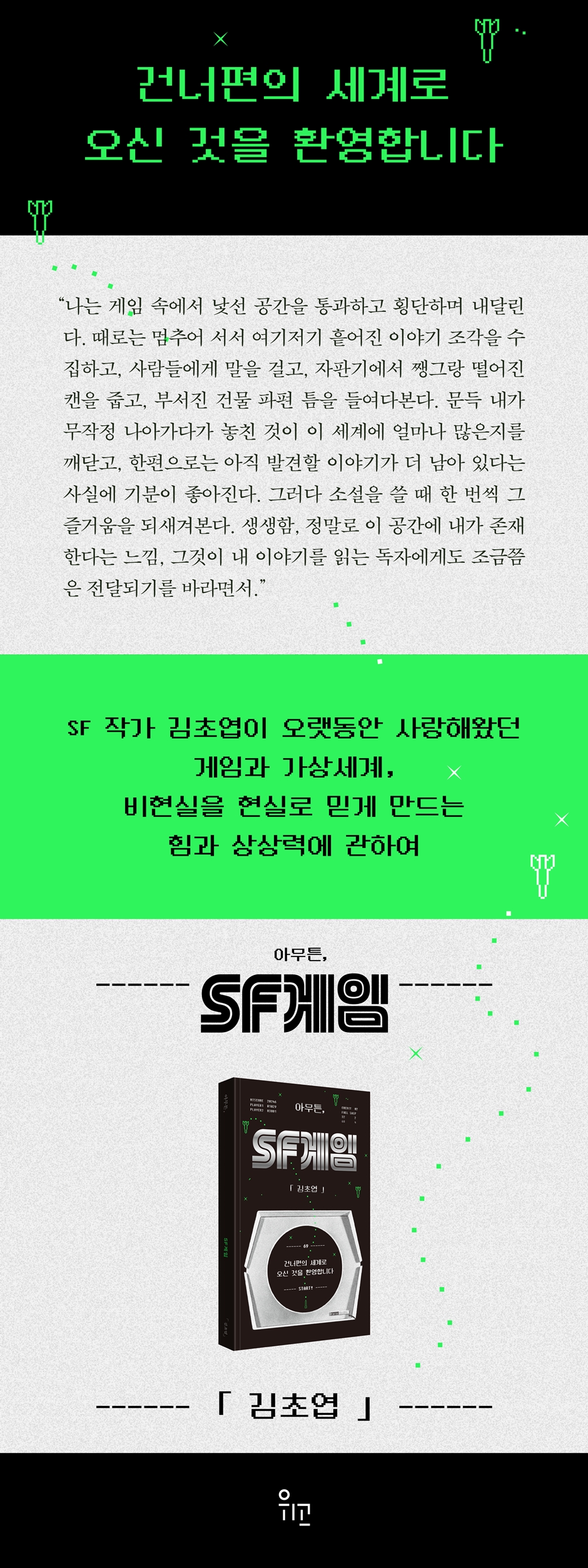
저자소개 (1명)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회원리뷰 (4건) 회원리뷰 이동
천선란 작가님의 아무튼 디지몬을 이은 아무튼 SF게임. 김초엽 작가님의 에세이인데, 이 책도 재밌다. 사실 게임은 익숙하지 않은 장르라 생소한 내용들이 참 많았는데, 새로운 걸 얕게나마 알아간다고 생각하니까 나름대로 괜찮았던 것 같다. 아무튼 시리즈가 인기 있는 이유가 있다.
리뷰제목
천선란 작가님의 아무튼 디지몬을 이은 아무튼 SF게임. 김초엽 작가님의 에세이인데, 이 책도 재밌다. 사실 게임은 익숙하지 않은 장르라 생소한 내용들이 참 많았는데, 새로운 걸 얕게나마 알아간다고 생각하니까 나름대로 괜찮았던 것 같다. 아무튼 시리즈가 인기 있는 이유가 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김초엽 작가님의 신간!아무튼, sf게임…!!게임 거의 안 하고 별로 안 좋아하지만 아무튼 시리즈에 관심이 많고 김초엽 작가님이 쓰신 게임에 관한 글이 궁금해 읽어보았어요!읽어보니 아주 흥미로웠고 재밌었어요. 추천드립니당 ㅎㅎ!
리뷰제목
너무너무 좋아하는 김초엽 작가님의 신간!
아무튼, sf게임…!!
게임 거의 안 하고 별로 안 좋아하지만 아무튼 시리즈에 관심이 많고 김초엽 작가님이 쓰신 게임에 관한 글이 궁금해 읽어보았어요!
읽어보니 아주 흥미로웠고 재밌었어요.
추천드립니당 ㅎㅎ!
아무튼, sf게임…!!
게임 거의 안 하고 별로 안 좋아하지만 아무튼 시리즈에 관심이 많고 김초엽 작가님이 쓰신 게임에 관한 글이 궁금해 읽어보았어요!
읽어보니 아주 흥미로웠고 재밌었어요.
추천드립니당 ㅎㅎ!
에세이는 잘 읽지 않는 편인데 게임이야기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라서 그런지 뭔가 소설속에 빠지는 느낌도 들고 엄청 재밌게 읽었습니다. 작가님의 소설도 하나하나 꼭 읽어보고 픈 느낌이 들었어요게임 이야기들 다 흥미롭고 아기자기 하고 잘 산거 같아요.
리뷰제목
에세이는 잘 읽지 않는 편인데 게임이야기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라서 그런지 뭔가 소설속에 빠지는 느낌도 들고 엄청 재밌게 읽었습니다. 작가님의 소설도 하나하나 꼭 읽어보고 픈 느낌이 들었어요
게임 이야기들 다 흥미롭고 아기자기 하고 잘 산거 같아요.
게임 이야기들 다 흥미롭고 아기자기 하고 잘 산거 같아요.
아무튼 sf 게임게임 연구는 직접 플레이해보지 않으면 읽기가 조금 더 어렵다는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플레이 방식과 시스템 매커니즘까지게임에 대한 전반적인 애정으로 써내려간 책으로 추천드리며sf보다는 게임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는 책입니다특히 한국의 게임 커뮤니티는 사회와 게임을 연결하는 일에 배타적이며 특히 다양성에 대한 논의가 억압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들었
리뷰제목
아무튼 sf 게임
게임 연구는 직접 플레이해보지 않으면 읽기가 조금 더 어렵다는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플레이 방식과 시스템 매커니즘까지
게임에 대한 전반적인 애정으로 써내려간 책으로 추천드리며
sf보다는 게임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는 책입니다
특히 한국의 게임 커뮤니티는 사회와 게임을 연결하는 일에 배타적이며 특히 다양성에 대한 논의가 억압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들었습니다
게임 연구는 직접 플레이해보지 않으면 읽기가 조금 더 어렵다는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플레이 방식과 시스템 매커니즘까지
게임에 대한 전반적인 애정으로 써내려간 책으로 추천드리며
sf보다는 게임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는 책입니다
특히 한국의 게임 커뮤니티는 사회와 게임을 연결하는 일에 배타적이며 특히 다양성에 대한 논의가 억압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