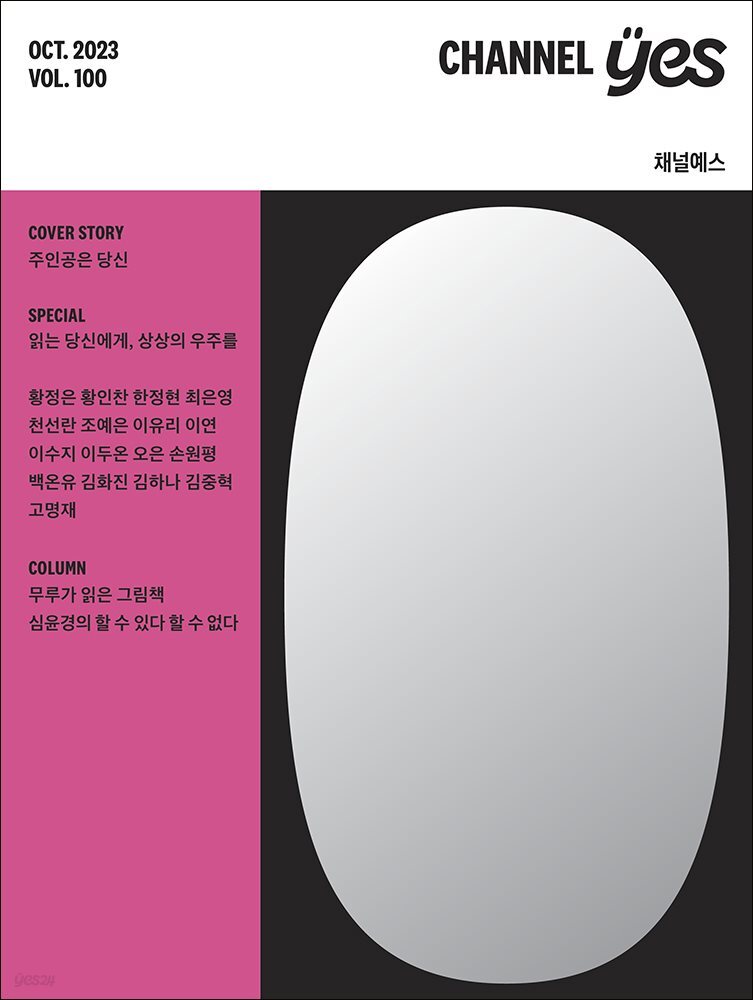이 도서의 시리즈 내서재에 모두 추가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회원리뷰 (1건) 회원리뷰 이동
무언가 변화의 조짐이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이별을 맞이할 줄은 몰랐다.
100호를 맞이해서 어떤 특집일까 궁금했던 내게, 표지의 텅빈 주인공 자리는 의아했다.
주인공이 당신이라는 커다란 제호 아래, 권두언(뭐라고 이름을 붙여야 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가장 첫 페이지에 있는 글이니까 그렇게 불러본다)에는 충격적인 이별을 고하는 말이 적혀 있다.
책에 관한 잡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시시포스의 일과 같습니다. 굴리고 또 굴리면 새로운 마감이 찾아옵니다. 2023년, <채널예스>는 100호를 마지막으로 잠시 쉬어 갑니다. 2024년부터는 계간지로 독자분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쉬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더 담을 수 있고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기에 그들만을 탓할 수는 없을 것 같다.
11월, 부산 서면점이 폐점할 예정이라는 안내문을 보았다.
책을 만드는 것도, 파는 것도, 중고책을 유통시키는 것도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시대이다.
독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책을 사는 것도, 읽는 것도, 보관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다.
되도록 많은 책을 사고싶지만 경제적인 한계가 있고, 많은 책을 읽고 싶지만 시간적 한계가 있고, 보관하는 데엔 공간적 한계가 있다. 아마 만들고 유통시키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한계들이 있겠지.
그동안 나에게도 좋은 추억을 주었던 잡지이기에 아쉬운 마음이 크다.
내년엔 계간지로 다시 돌아올 예정이라니 기대해본다.
이번호는 100호 특집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까지 인터뷰했던 작가들의 인터뷰 중 인상깊었던 구절을 모아놓기도 하고,
가장 좋아하는 책을 물었다고 했다.
100명의 작가 중 17명이 답을 해온 덕분에 작가의 에세이와 추천도서를 만날 수 있어 좋았다.
다들 멋진 책을 추천했는데, 나는 <에밀과 탐정들>, <로테와 루이제>를 추천한 김화진 작가에 눈이 갔다.
내가 어린시절 너무 좋아했던 책이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사줬던 책이라 그런가보다.
많은 책들이 소개되어 있어 천천히 읽어보려고 한다.
100호의 기쁨과 이별의 아쉬움이 함께했던,
<채널예스 100호>이다.
한줄평 (0건) 한줄평 이동
첫번째 한줄평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