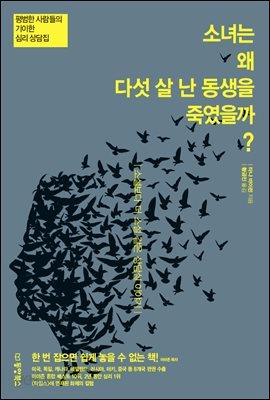해골 찬장(THE SKELETON CUPBOARD)
이 책의 원제입니다. '집안의 치부 혹은 비밀'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하면
"소녀는 왜 다섯 살 난 동생을 죽였을까?" 라는
제목은 매우 노골적입니다.
어떤 제목이냐에 따라 독자의 선택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일단 이 책을 펼쳐든다면 끝까지 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소설 혹은 드라마, 영화같은
이야기라서...
환자에 대한 비밀 보장 의무를 지키기 위해 등장인물과
정황 등을 가공했기 때문에 여기에 소개된 사례들은 전부 허구입니다.
저자 타냐 바이런은 영국의 임상 심리학자이자 아동
심리학자로 2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임상 경험을 쌓은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은 자신이 임상 심리학자가 되기
전 실습생 시절의 경험담, 그때의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가장 서툴고 미숙하던 실습생 시절의 기억을
끄집어냈을까요.
그녀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나는 정신 건강 분야 종사자들이 자신들이 직접 다룬
사례라며 내놓은 책을 수없이 많이 읽어보았다.
그런 책을 읽을 때마다 퍼뜩드는 생각은 스포트라이트가
치료를 받는 사람들에게만 집중되고 그 치료를 맡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절대 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가 보기에 이러한 접근법은 세상에는 '미친'
사람들과 '미치지 않은' 사람들만 있다는 아주 위험하고도 보편적인 믿음을 조장하는 듯하다.
또한 정신 건강 분야 종사자의 역할을 과대평가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가 어느 정도 거리를 둔 채 유리한 위치에서 관찰하고 평가하고 처방하고
치료하는 사람들처럼 보일 것이다.
나는 우리 일이 그런 식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요컨대 온전한 정신의 끝은 어디며, 정신이상의
시작은 어디인가?
우리는 그런 부분을 그들의 문제로 돌리고는
'환자'라는 꼬리표 뒤에, 문제가 있는 건 그들이지 우리가 아니라는 착각 뒤에 숨는 것이다.
... 안타깝게도 이 책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실제
존재한다는 것, 그들의 일부가 우리 모두의 내면에 존재한다는 말을 남기고 싶다." (에필로그 중에서)
우선 이 책을 쓴 타냐 바이런의 솔직함에
감탄했습니다. 치료를 하는 사람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혼돈에서 질서를 향하여 헤쳐나가는 사람으로 그려냈습니다. 조금은
미숙해도, 환자에게 전이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조차도 인간적이라서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돕고 싶어하는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25년 간 심리치료를 하면서 자신이 전보다 더 나은
인간이 될 기회를 갖게 된 건 그들 덕분이라는 말에 감동했습니다.
누구나 각자 나름의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은 전혀 모르는 불안증이나 강박증일 수도 있고,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일 수도 있습니다. 혼자 해결하느냐 아니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느냐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당신은 건강합니까?
우리 몸의 건강을 체크하듯이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컨디션이 최상일 때도 있지만 너무 안좋아서 치료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정신 건강에 문제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편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일종의
두려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내면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은 두려움이라고 해야 할까. 어쩌면
숨기고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치료조차 받지 못한 채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책에 소개된 사례들은 굉장히 심각한 경우지만
적어도 치료를 받았습니다. 물론 치료 결과가 모두 성공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아플 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그건
함께 해줄 '사람'이 아닐까요. 우리는 감히 상상도 못할 고통과 불행을 겪은 아이들을 보면서 두 팔 벌려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이 세상에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사람만 있었더라도 피할 수 있는 불행이 아니었을까요. 아픈 마음을 치료하는 건 병원이 아니라, 결국
'사랑'이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