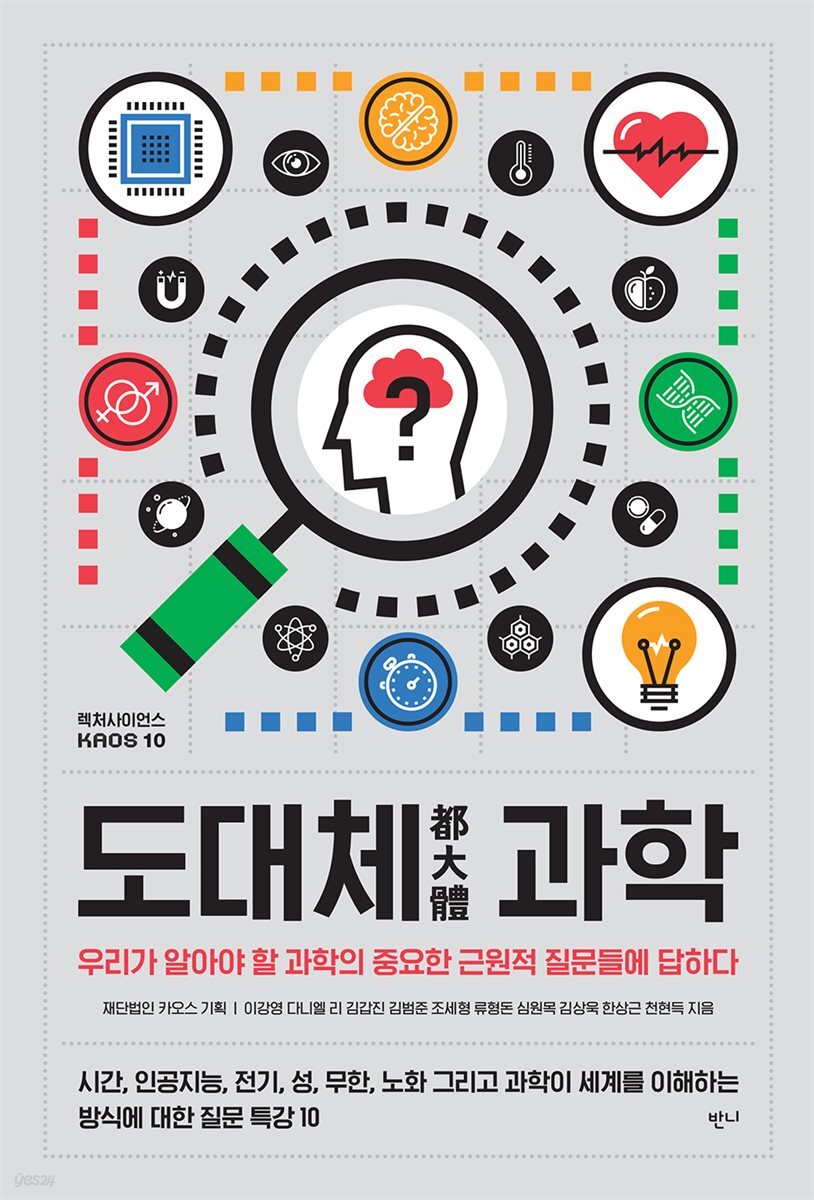이 상품의 태그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소개 (10명)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회원리뷰 (3건) 회원리뷰 이동
도대체의 사전적 의미는 ‘주로 의문문에 쓰여, 놀람, 걱정, 궁금한 심정 등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제목에 도대체가 들어가면 알 듯 말 듯 애매한 것을 가리키며,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쓰인다. 2019년 가을에 실시했던 카오스 가을 강연의 주제는 ‘도대체 과학’이다. 9번의 강연 주제들을 살펴보면 에너지, 엔트로피, 전기와 자기, 시간, 성(sex), 성장과
리뷰제목
도대체의 사전적 의미는 ‘주로 의문문에 쓰여, 놀람, 걱정, 궁금한 심정 등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제목에 도대체가 들어가면 알 듯 말 듯 애매한 것을 가리키며,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쓰인다. 2019년 가을에 실시했던 카오스 가을 강연의 주제는 ‘도대체 과학’이다. 9번의 강연 주제들을 살펴보면 에너지, 엔트로피, 전기와 자기, 시간, 성(sex), 성장과 노화, 뇌, 인공지능, 무한이다. ‘도대체 에너지란 무엇일까?’, ‘도대체 무한이란 무엇일까?’ 등등. 하나같이 과학에서 다루고 있지만, 정의하기가 그리 쉽지 않은 것들이다. 이들 질문에 대해 이야기하다보니 자연스레 ‘도대체 과학이란 무엇일까?’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도달했다고 한다.
머리말을 읽다보니 나 또한 과학이 무엇인지 아리송해진다. 그래서 9개의 주제에 대한 강연을 건너뛰어 천현득 서울대 교수가 강연한 10강 ‘과학, 세계를 이해하는 그 특별한 방식에 대해여’를 먼저 읽기 시작했다. 과학이란 말은 일본인들이 영어 사이언스(science)를 한자로 번역한 것으로, 우리는 대부분의 학술용어가 그러하듯 그것(科學)을 차용하여 사용한다. 그러나 사이언스라는 말도 19세기에 들어서야 생겨나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강연자는 말한다. 그러니까 사이언스란 말이 생겨나기 전에는 뉴턴이나 갈릴레오 같은 사람들을 과학자가 아닌 수학자 혹은 자연철학자라고 불렀다. 이는 과학과 철학이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같은 뿌리를 공유했기 때문이며, 따라서 과학의 역사는 철학으로부터 독립의 역사였다고 한다. 16-17세기 과학 혁명기를 거치면서 역학이라는 물리학 분야가 형성되고 이것이 18세기 들어 물리학으로 독립했다. 이어서 화학이 독립하고, 19세기가 되면서 생물학이 철학으로부터 독립하면서 과학이라는 학문이 새롭게 정립되었다는 것이다. 강연자는 세계를 이해하는 방법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과학이 특별한 이유는, 과학이 이해하는 세계는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과 다르며 더 믿을 만한 지식을 주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는 과학이 현상을 확립하고, 확장하고, 그것을 설명하는 것, 즉 과학적 설명은 ‘왜?’ 라는 물음을 던졌을 때 그에 대해서 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 일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들에 대해 근원을 밝혀내는 것은 쉽지 않다. 질문을 통해 답을 얻고 그 안에서 또 다른 질문을 찾아내고 다시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과학이지만 말처럼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9개의 강연 중에서 흥미로웠던 강연은 두 번째 강연인 다니엘 리 교수의 ‘인공지능과 로봇지능’, 그리고 다섯 번째 강연인 조세형 교수의 ‘성’이었다.
‘인공지능과 로봇지능’에 대한 강연에서 다니엘 리 교수는 로봇에 인공지능을 탑재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자연지능이 인간과 동물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가를 의미한다면, 인공지능은 컴퓨터가 스스로 사물인지 방법을 배우거나 터득하는 것을 말한다. 인간과 기계의 차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체스, 게임, 바둑 등에서 벌어진 대결에서 이미 기계는 인간을 앞섰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 때 필요한 것이 데이터이다. 그런데 이런 인공지능을 로봇에 탑재할 수 있을까? 강연자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현실세계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한다. 변화하는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있어야 하는데 로봇의 문제는 이러한 데이터 수집비용이 편익에 비해 너무나 높다는 것이다. 또한 AI와 로봇공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더 잘 이해하여야 하는데, 아직도 우리는 인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갈 길이 멀다고 한다. 강연을 읽으면서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저절로 떠오를 수밖에 없음을 느꼈다.
조세형 교수는 ‘성: 성이라는 수수께끼’ 강연에서, 생물학자들은 성을 자신을 닮은 어떤 개체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생식의 측면에서 바라보며, 이렇게 볼 때 성이란 서로 다른 두 개체가 가진 유전 정보를 서로 섞는 일이라고 말한다. 무성생식은 세포 안에 있는 유전물질을 복제한 후 그 세포가 자라서 분열하는 세포분열과정을 통해 자신과 동일한 개체를 만들어낸다. 반면에 유성생식은 2개로 구별되는 서로 다른 두 성이 유전정보의 절반씩을 자손에게 전한다. 따라서 유성생식에서는 성 결정과 성 분화라는 별도의 도구들이 필요하며, 이는 시간과 자원이 많이 소요됨을 의미한다. 즉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이중비용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진핵생물들은 유성생식을 진화의 과정에서 선택하고 발전시켜왔는데, 이런 유성생식의 이점이 무엇인지를 강연자는 살펴보고 있다. 그는 자손의 다양성, 해로운 돌연변이의 제거, 종간 경쟁 등 그동안 과학자들이 제기했던 가설들을 통해 유성생식이 가질 수 있는 이점들을 하나하나 따져본다. 하지만 그것들 모두보다도 유성생식이 치루는 이중비용이 훨씬 더 과도하다며, 우리는 아직까지도 확실한 이유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말한다. 역시 ‘도대체 성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떠오르게 만든다.
다른 강연을 읽으면서는 흥미롭지만 이해가 힘든 부분도 있었다. 예를 들면 ‘시간’이나 ‘무한’과 같은 주제가 그러했다. 그럼에도 강연집은 과학이 우리의 일상과 관계없는 학문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라는 것, 그리고 질문을 통해 보다 근원적인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걸 실감할 수 있게 해주었다. 학교 다니면서 부담을 가지고 배웠던 과학에서 벗어나 마음 편히 생각하며 읽을 수 있다는 것이 과학을 새롭게 알아가는 즐거움을 준다.
과학 관련 독서모임이 있어서 과학입문책을 찾아봤다. ''이 책은 우리 일상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과학의 중요한 질문들을 주제로 한, 과학재단 KAOS의 2019년 가을 강연 ‘도대체’를 엮은 것이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펼친 근원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이 담겨 있다.'' 10가지 주제에 대한 10가지 분야의 과학자들이 풀어 설명하다보니 과학 전반에 대한 흐름과 이해를 도울 수 있었다.
리뷰제목
과학 관련 독서모임이 있어서 과학입문책을 찾아봤다.
''이 책은 우리 일상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과학의 중요한 질문들을 주제로 한, 과학재단 KAOS의 2019년 가을 강연 ‘도대체’를 엮은 것이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펼친 근원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이 담겨 있다.''
10가지 주제에 대한 10가지 분야의 과학자들이 풀어 설명하다보니 과학 전반에 대한 흐름과 이해를 도울 수 있었다.
말미잘, 해파리를 비롯한 몇몇 동물은 영원히 죽지않는 것으로 밝혀졌고, 식사를 제한 할수록(적게 먹을수록) 더 건강하며 노화를 늦출 수 있고, 열도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고, 갈수록 늘어나는 데이터 저장 문제와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 등
과학책은 항상 새로운 지식을 더해준다.
한치 앞도 모르는 인간이지만 향후 펼쳐질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정말 궁금하다.
''이 책은 우리 일상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과학의 중요한 질문들을 주제로 한, 과학재단 KAOS의 2019년 가을 강연 ‘도대체’를 엮은 것이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펼친 근원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이 담겨 있다.''
10가지 주제에 대한 10가지 분야의 과학자들이 풀어 설명하다보니 과학 전반에 대한 흐름과 이해를 도울 수 있었다.
말미잘, 해파리를 비롯한 몇몇 동물은 영원히 죽지않는 것으로 밝혀졌고, 식사를 제한 할수록(적게 먹을수록) 더 건강하며 노화를 늦출 수 있고, 열도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고, 갈수록 늘어나는 데이터 저장 문제와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 등
과학책은 항상 새로운 지식을 더해준다.
한치 앞도 모르는 인간이지만 향후 펼쳐질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정말 궁금하다.
과학 관련 독서모임이 있어서 과학입문책을 찾아봤다. ''이 책은 우리 일상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과학의 중요한 질문들을 주제로 한, 과학재단 KAOS의 2019년 가을 강연 ‘도대체’를 엮은 것이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펼친 근원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이 담겨 있다.'' 10가지 주제에 대한 10가지 분야의 과학자들이 풀어 설명하다보니 과학 전반에 대한 흐름과 이해를 도울 수 있었다.
리뷰제목
과학 관련 독서모임이 있어서 과학입문책을 찾아봤다.
''이 책은 우리 일상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과학의 중요한 질문들을 주제로 한, 과학재단 KAOS의 2019년 가을 강연 ‘도대체’를 엮은 것이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펼친 근원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이 담겨 있다.''
10가지 주제에 대한 10가지 분야의 과학자들이 풀어 설명하다보니 과학 전반에 대한 흐름과 이해를 도울 수 있었다.
말미잘, 해파리를 비롯한 몇몇 동물은 영원히 죽지않는 것으로 밝혀졌고, 식사를 제한 할수록(적게 먹을수록) 더 건강하며 노화를 늦출 수 있고, 열도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고, 갈수록 늘어나는 데이터 저장 문제와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 등
과학책은 항상 새로운 지식을 더해준다.
한치 앞도 모르는 인간이지만 향후 펼쳐질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정말 궁금하다.
''이 책은 우리 일상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과학의 중요한 질문들을 주제로 한, 과학재단 KAOS의 2019년 가을 강연 ‘도대체’를 엮은 것이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펼친 근원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이 담겨 있다.''
10가지 주제에 대한 10가지 분야의 과학자들이 풀어 설명하다보니 과학 전반에 대한 흐름과 이해를 도울 수 있었다.
말미잘, 해파리를 비롯한 몇몇 동물은 영원히 죽지않는 것으로 밝혀졌고, 식사를 제한 할수록(적게 먹을수록) 더 건강하며 노화를 늦출 수 있고, 열도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고, 갈수록 늘어나는 데이터 저장 문제와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 등
과학책은 항상 새로운 지식을 더해준다.
한치 앞도 모르는 인간이지만 향후 펼쳐질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정말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