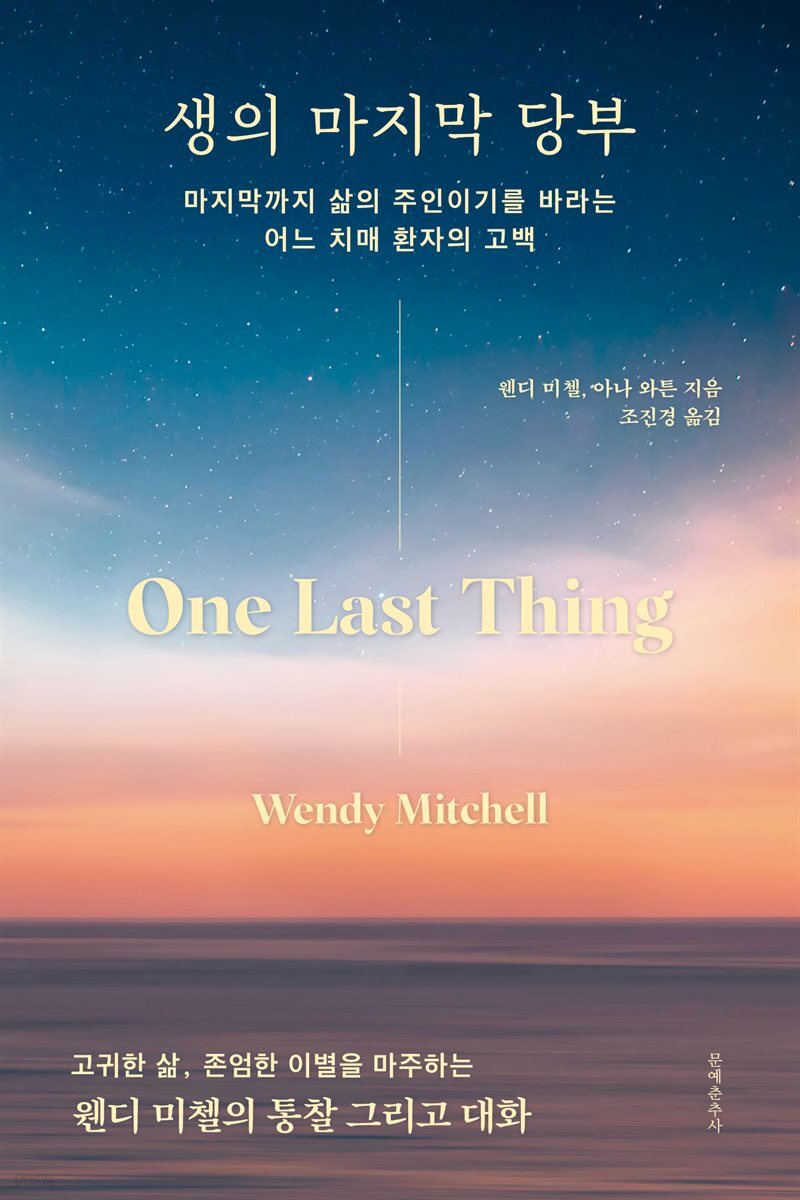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상세 이미지 상세 이미지 보이기/감추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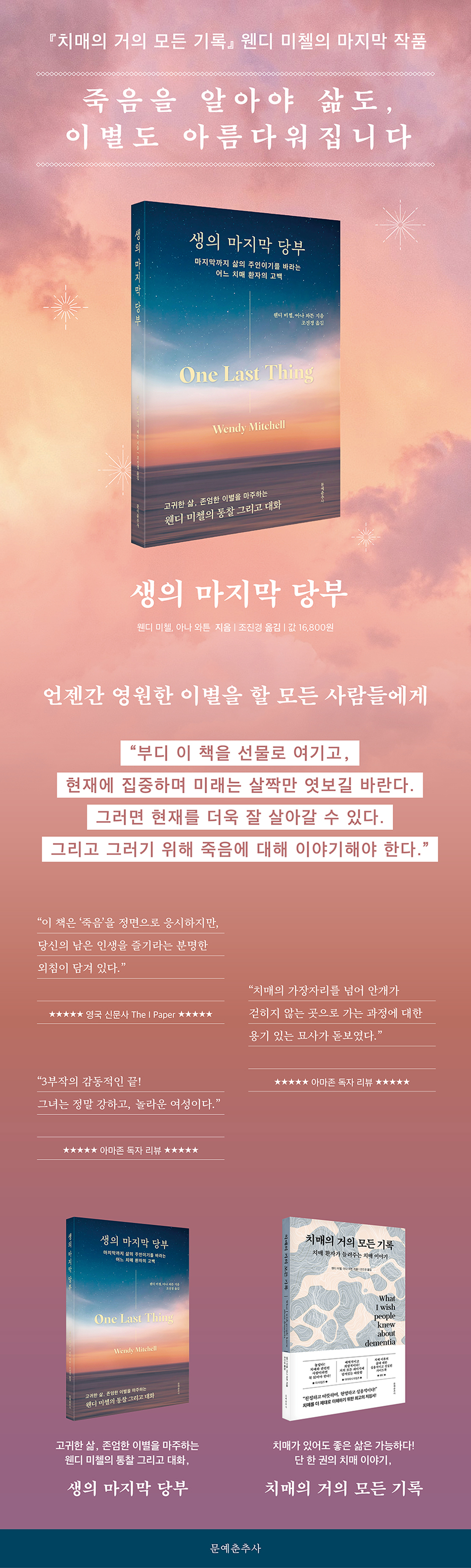
저자소개 (2명)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회원리뷰 (150건) 회원리뷰 이동
마지막까지 삶의 주인이기를 바라는 웬디 미첼의 책
생의 마지막 당부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책 표지는 희망을 표현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지는 석양의 느낌도 있습니다.
지은이 웬디 미첼은 20년 동안 영국국민의려보험에서 비상임팀 팀장으로 일하던
중 2014년 7월 58세에 조기 발병 치매 진단을 받습니다.
사회나 병원 모두 치매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
치매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진단 이후에도 삶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일을
헌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생의 마지막 당부이자 치매환자인 지은이 웬디 미첼의 통찰의 고백서
이기도 합니다.
책은 담담한 기록이고 고백서 인데 첫 페이지를 여는 순간부터
마음이 먹먹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프롤로그 첫 줄 이 책은 당신의 현재를 위한 선물입니다로 시작됩니다
우리 인간은 믿기 힘든 생존 본능이자 먹구름 속에서 빛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분들은 경험을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던 사람들과
나누웠던 대화에 참여한다는 느낌으로 읽어주었으면 좋겠다고 안내합니다
지은이는 의료전문가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눌수록
현재를 살아갈 힘이 더 커진다는 점을 일깨워 주도 싶을 뿐이라는 희망을 이야기 합니다
이 책을 선물로 여기고 현재에 집중하며 미래는 살짝만 엿보길 바라기에
현재를 더욱 잘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지은이 웬디미첼은 나의 사전 돌봄계획서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전 돌봄 계획서는 건강할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생애 어느 단계에서나
작성할 있고 , 앞으로 행동 불능 상태가 되거나 스스로 말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에 받기를 원하는 치료를 진술해 놓은 계획서라고 합니다.
지은이는 희망의 글로 현재를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녀는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기록하며 치매 때문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어둠, 동물, 죽음이 두렵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점을 찾고 치매가 자신을 더
대담하게 만들고 인생에 대한 강한 집착을 놓을때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글의 내용이 인상적이였습니다.
#생의마지막당부
#문예춘추사
#웬디미첼
#아나와튼
#조진경
#컬처블룸서평단
#컬처블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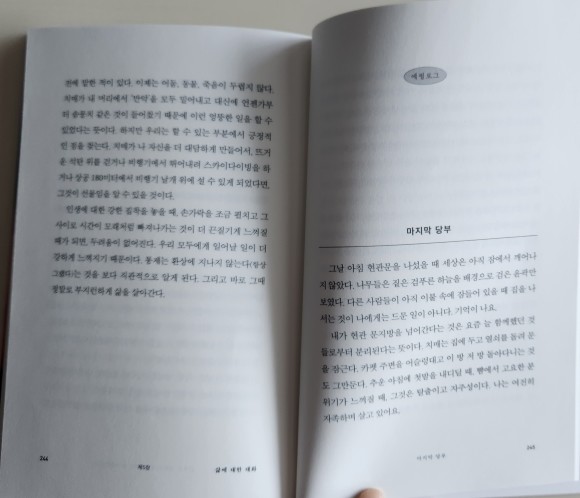

치매, 연명치료, 존엄사, 죽음 등등
이 책에는 평소 우리가 무겁고 어둡게 생각하여
입 밖으로 쉬이 꺼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저자는 치매환자이면서 여러권의 책을 저술한 저자이다.
맑은 정신으로 또렷하게 기억하는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저자는
우리가 생애의 마지막에 다다라서야 생각해볼만한 주제들을
자신의 입장에서 풀어내고 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100퍼센트 확실한데
사람들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는다.
존엄사의 합당함을 이야기하는 저자는
누구나 맞이하는 죽음의 순간에 존중 받고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할 당위성을 이야기한다.
고통이 심하거나 삶의 연장이 큰 의미가 없고 비참한 상태를 보여야 하는 당사자에게는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필요가 있기에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감한 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쉽게 이렇게 저렇다 주장할 수가 없다.
평소 뉴스에서나 봤던 이야기들이라 생각을 할수록 어렵게만 느껴졌다.
나는 임종 시의 선택권과 존엄성에 대하여 알고 싶고
이처럼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
'자살 생각'과 같은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다만,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존엄사와 자살이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떻게 구별해야 하고, 선택권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지가
미묘하고 민감하여 당사자가 아니라면 찬반을 무조건 주장할수만 없다.
저자의 경우는 치매를 앓고 있어서
본인의 질병이 자신의 추한 마지막을 가져올 것이 싫다는 것이
존엄사 주장의 큰 논조이지만,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쉽게 동의되지는 않았다.
이를 제도적으로 허용한다면
또 이를 악용하여 자살의 미화가 일어날 가능성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고통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좋은 선택일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이 존엄한 죽음이라는 모순된 느낌의 표현으로 주장될 수 있다.
허나, 이것이 제도적으로 보편적으로 허용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보인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나라들이 존엄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된다.
무겁고, 유쾌하지 않은 주제이기에 쉽게 읽혀지지는 않았지만,
한번쯤은 생각해볼만한 내용이기에 의미가 있었다.
|
|